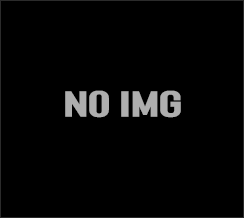곽노필의 미래창
서울대 연구진, 1991~2020년 분석 결과
집중 발생기간, 4월초에서 3월 중순으로

23일 저녁 경북 의성군 점곡면 야산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 22일 시작된 경북 지역 일대의 산불은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불로 지금까지 수십명의 사망자를 포함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여의도의 160배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봄철에 유난히 잦은 산불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마찬가지로 땅 위이 모든 걸 없애 폐허로 만들어 버린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만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고, 피해 면적은 한국 땅 넓이의 수십배인 350만~4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산림 면적이 전 국토의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4위인 한국도 산불 피해가 잦은 국가 중 하나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산불에 취약한 자연 환경을 만들고 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임상준 교수(산림공학)가 이끄는 연구팀이 1991~2020년 발생한 산불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산불은 연 평균 5.82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산불 발생 기간도 25일 더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산불 피해의 80%가 4~5월에 집중돼 있고, 대형 산불은 주로 북서-남동 장축을 따라 강원과 경북에서 발생했다.
이달 초 국제학술지 ‘자연 재해’(Natural Hazard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국내에선 연평균 451건의 산불이 나 약 2085㏊의 산림을 태웠다. 산불이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01년으로 785건, 가장 적게 발생한 해는 1991년으로 139건이었다.
피해 규모가 100㏊를 넘는 대형 산불은 전체 건수의 0.4%에 불과했지만 불에 탄 면적은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임 교수는 “30년 동안 전체적으로 소형 산불을 중심으로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피해 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2020년 이후엔 산불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겨울·봄 가뭄 심해지고 눈 일찍 녹은 영향
특히 산불 발생 기간이 144일(1991~2005)에서 169일(2006~2020)로 25일 길어졌다. 산불 시작 시점은 17일 당겨졌고, 끝나는 시점은 8일 늦춰졌다. 연구진은 “기온 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해 겨울과 봄 가뭄이 더 길고 심해지면서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2020년 이후엔 산불 발생 건수가 더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불 집중 발생 기간도 약 10일 앞당겨져 4월 초에서 3월 중순으로 옮겨졌다. 올해의 산불 사례는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연구진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난화와 적은 강설량으로 인해 산에 쌓인 눈이 일찍 녹은 것이 산불이 더 일찍 발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석했다.
영국 런던정경대의 토마스 엘 스미스 교수(환경지리학)는 사이언스미디어센터에 게시한 논평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화재 위험이 특히 큰 시기로 식물은 여전히 ‘겨울잠’에 있는 와중에 날씨는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해 기온이 예년보다 10도까지 올랐다”며 “나무는 봄에 ‘녹화’되기 전 휴면 상태일 때 특히 불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휴면 상태에서는 나무가 습도를 조절할 수 없어, 고온 건조한 조건에서는 빠르게 말라 버려 불이 쉽게 붙는다는 것이다.
산불이 집중되는 기간은 3~5월로 전체의 62%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규모도 커서 4~5월에 소실되는 면적이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특히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는 4월이다. 4월은 연중 습도가 가장 낮은 시기다. 4월 대형 산불이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월(13), 5월(3건) 차례였다.

대형 산불, 남북 종축 길어지고 동서 횡축 짧아져
연구진이 주목한 한국 산불의 또다른 특징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과 부산 인근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임 교수는 “서울, 부산 행정구역 내의 발생건수는 줄었지만, 주변 근교를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의 발생 건수는 늘어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대도시 주민의 여가 활동 증가, 즉 캠핑이나 등산, 야외활동이 대도시를 벗어나 주변 근교 지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 면적이 큰 대형 산불은 북서-남동 종축을 따라 남북으론 길어지고 동서 횡축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대형 산불이 강원과 경북에 집중되면서 총 소실 면적의 각각 41%와 33%를 차지했다.
연구진은 “강원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숲이 더 울창(2021년 186.9m3/ha)하고 강풍(풍속 25m/s 이상)이 자주 발생해 화재에 더욱 취약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마른 소나무 잎과 송진이 화재를 빠르게 번지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변화가 주된 원인인 세계적인 흐름과 달리 한국에선 인간 활동이 주된 원인인 것도 국내 산불의 특징으로 지적됐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모든 산불의 절반은 야외 활동 중 부주의(49%)였다. 주말 화재 비중이 35.0%에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37%로 높아진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어 농사 작업 중 부주의(18%), 흡연(10%) 차례였다.

대형 산불은 북서-남동 종축을 따라 남북으론 길어지고 동서 횡축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과 비슷
영국 셰필드대 킴벌리 심슨 박사는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과 지금의 한국 산불은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두 지역의 산불 모두 평년보다 매우 따뜻하고 건조한 기상 조건으로 식물의 가연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였고, 강풍으로 인해 화염이 번질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한국의 산림은 20세기 초 이후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됐다. 1960년대 산림 면적은 ㏊당 6㎥로 줄었다. 이후 1973년 시작된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이후 꾸준한 조림 정책에 힘입어 본래의 울창한 모습을 회복했다. 산림 면적당 나무 총량은 2023년 현재 헥타르당 176㎥로 1973년(11.3㎥)의 15배를 웃돈다. 이는 한국의 산에는 언제든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연료가 갖춰져 있다는 걸 뜻한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 산불 발생은 다른 어떤 기상 요소보다 강우량, 강우일수와 높은 연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산불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봄은 더 길고 건조해지고 여름은 더 짧고 습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러한 기후 변화는 건기의 지속 기간과 심각성을 증가시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런던대 이안 켈만 교수(재난 및 건강 연구소)는 “산불이 악화되는 주요 요인은 토지 이용 변화, 즉 숲 조성과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라며 “한국 산불에 대한 시기적절한 분석을 수행한 이번 연구는 한국이 산불 예방과 대응에 훨씬 더 힘써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논문 정보
Spatial and temporal variability of forest fires in the Republic of Korea over 1991–2020. Nat Hazards (2025).
https://doi.org/10.1007/s11069-025-07169-4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