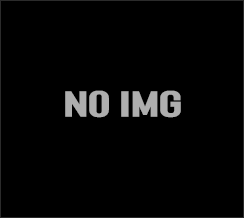전해원 KAIST 교수 연구팀 분석
“무분별한 대응이 식량위기 부를수도”

전해원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가 발표한 대륙별 농경지 변화율. 1.5도 시나리오에 맞출 경우, 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에서 농경지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KAIST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 농경지를 줄여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후위기가 빠르게 현실화되는 가운데, 인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면서도 식량위기까지 고민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됐다.
전해원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이 전 세계 농경지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4월호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현재 국제 사회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5년에 195개 당사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약을 채택했고, 2018년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1.5도가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노선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KAIST 연구진은 1.5도 목표를 위한 정책들이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2.8%를 줄일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특히 남미는 농경지가 24%나 감소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전체 농경지 감소의 81%가 개발도상국에 몰릴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토지의 이용 목적이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림 면적을 늘리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연료 재배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경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남미 쪽 토지는 단위면적당 탄소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농경지를 줄이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농경지의 감소는 식량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식량 수출국의 수출 능력이 12.6%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식량 생산 대국들의 수출 능력이 각각 10%, 25%, 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결과가 현실화된다면 인류는 기후위기 대응과 식량 안보가 상충되는 와중에 둘 다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식량위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만약 2030년 이후에 1.5도 목표를 달성하면, 수십 년간 지구 온도가 크게 오르는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 교수는 “전 세계적 탈탄소화 전략을 세울 때는 여러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한 나머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맥락을 보지 못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 교수는 “개발도상국은 농경지가 줄어들고 수입 의존도는 높아지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면서도 “오늘날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기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국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