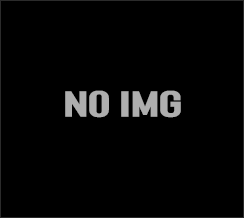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
디펜스 테크 뛰어든 한국 유망기업
■ 경제+
「 “우린 더 이상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 8년 전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에서 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발언은 2025년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더 노골적이고 강력해졌다. ‘세계 경찰’ 지위를 내려놓은 미국, 우리 돈 1258조원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한 유럽연합 등 글로벌 각자도생은 한창이다. 이에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는 ‘디펜스 테크’ 분야는 최전성기를 맞고 있는 상황. 군수 AI 소프트웨어를 파는 미국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은 세계 최대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을 제친 지 오래다. 쉴드AI, 안두릴 인더스트리스 등 ‘IT 부스터’를 단 방산기업들도 무서운 속도로 크고 있다. ‘K-방산’은 어떨까. 지뢰 잡는 4족 보행 로봇부터 드론 잡는 드론까지, 디펜스 테크 전성시대를 일궈 나갈 국내 방산 스타트업을 분석했다.
」
◆IT 잡아야 방산 잡는다=‘최초의 지능화 전쟁’, ‘최초의 드론 전쟁’ 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다양한 수식어가 내포하듯 오늘날 군사력은 IT 경쟁력에 좌우된다. AI 기반 소프트웨어로 위성 및 드론 이미지 등을 활용해 지상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드론을 통해 표적 공격을 하는 식이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혁신단(DIU) 예산을 9억 83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로, 전년 대비 7배 이상 증액했다. DIU는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미국 국방부 산하에서 운영하는 조직이다. 장기영 경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공지능과 미래 안보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적 전망』(2024)에서 “강대국들은 AI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군사·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지구적 패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
◆K-방산, 테크로 ‘전선(戰線)을 간다’=국내 스타트업도 속속 방산에 뛰어들고 있다. 드론 제조업체 니어스랩은 AI 자율비행 기술을 가지고 2023년 방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카이든’은 드론 잡는 드론, 즉 하드킬(hard-kill, 적진의 드론을 그대로 들이받아 무력화시키는 방식)용 안티드론이다. 시속 250㎞ 초고속으로 날아가 드론을 격추한다. 니어스랩은 산업시설 점검에 활용해 온 영상 AI 분석·제어 기술을 카이든에 탑재해 여타 드론과 차별점을 뒀다. 이 회사 최재혁 대표는 “인간이 밧줄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풍력발전기 점검을 우리 드론으로 15분 만에 끝낼 수 있다”며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고 여러 대 드론을 효율적으로 관제하는 AI 자율비행 기술을 방산 분야에 접목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무인화가 핵심인 미래전에 대비해 처음부터 일회용 소모성 드론이라는 콘셉트로 (카이든을) 개발했다. AI 소프트웨어로 성능을 올리고 하드웨어 단가를 낮춰 미국 방산 드론 가격의 20분의 1 수준으로 시장에 내놨다”고 덧붙였다. 니어스랩은 카이든으로 우리 군 납품은 물론, 해외 기업들과 수출계약도 이뤄냈다.

김영옥 기자
공중에 드론이 있다면, 지상에는 로봇이 있다. 라이온로보틱스는 4족 보행로봇의 가능성을 보고 방산 분야에 뛰어든 3년 차 스타트업이다. 황보제민 대표(KAIST 교수)는 “불안정한 지대에서 한번 넘어졌을 때 4족이 2족보다 충격을 덜 받는다”면서 “아직 드론만큼 실전에 활발히 투입되진 않았지만, 우리 육군·싱가포르 국방연구소 등에서 우리가 개발한 4족 보행로봇 ‘라이보’를 구매해 지뢰밭·전쟁터 등 위험한 곳에 투입할 수 있을지 파일럿 스터디(실험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매출 중 80% 이상이 방산 분야에서 발생한다.
하드웨어뿐 아니라 데이터·보안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는 스타트업도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대 주주로 있는 젠젠에이아이는 생성 AI로 방산에서 활용 가능한 고품질 합성 데이터를 만든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2022년 이 회사를 설립한 조호진 대표는 “생성 AI가 학습하려면 이미지 데이터 수백만장이 필요한데, 이제 막 AI 기반 체계를 갖춰가는 방산 쪽에 데이터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디퓨전을 기반으로 CCTV·위성·열화상 센서 등 각각의 장치를 모사하는 AI로 최적화해 군사 및 방산용 데이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외에 날씨·시간대·계절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군사 데이터도 생성 AI를 통해 만든다. 예컨대 북한 관련 데이터의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양에 한계가 있어 AI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데 젠젠에이아이는 이와 관련해 표적이 폭발하거나 격추당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AI로 생성해낼 수 있다.
세계 암호학계 석학인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가 2017년 창업한 크립토랩은 양자컴퓨터라는 창에 맞설 방패, ‘양자내성암호’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동형암호’ 기술을 개발했다. 크립토랩은 이 기술로 국방 분야에도 뛰어들었고 현재 국방부 실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태경 크립토랩 동형암호팀장은 “국방 분야에선 AI 챗봇을 도입하려 해도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 있어 폐쇄적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며 “국방 데이터를 암호화해 AI를 학습시키는 커스터마이징 AI 챗봇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방산에 뛰어드는 이유=국내 스타트업이 방산에 뛰어드는 건 단지 디펜스 테크가 뜨는 산업이어서만은 아니다. 먼저, 딥시크·샤오미 등 가성비 기술이 강점인 중국은 방산 분야에선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군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이슈로 인해 미국·유럽에서는 사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심승배(AI·정보화 연구실) 박사는 “우크라이나의 경우만 봐도 전쟁 초반에는 중국산 드론을 쓰다가 성능·보안 등 문제로 이제는 자체 개발해서 쓴다”고 말했다.
저출생 등 시대적 흐름도 큰 고려 요소다. 라이온로보틱스 황보제민 대표는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생은 국방 분야 큰 고민거리일 것”이라면서 “부족한 군사력을 로봇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가 개발 중인 로봇이 대당 1억원대지만, 향후 대량생산하게 되면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훨씬 싸게 만들 수 있다”며 “또 국경·지뢰밭이나 폭탄 해체 작업 등 위험하고 인간이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에서 로봇이 해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팔란티어 만들려면=방산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전문가들은 협력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차정미 국회 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체계기업(전통적인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회사) 위주로 소수에 의존하기보다 이 분야 벤처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IT 기업들은 방산 분야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며 “팔란티어, 쉴드 AI 등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들은 ‘매케인 모멘텀’ 덕분에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모멘텀은 중국·러시아의 국방 기술력이 강해지던 2015년 존 메케인 상원 국방위원장이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찾아가 국방사업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한 때를 말한다. 이후 정부와 테크업계는 실리콘밸리 방위 그룹(Silicon Valley Defense Group, SVDG)을 만들었다. SVDG는 정부, 방산기업, 투자자 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됐다. 심승배 박사는 “테크 분야에서 체계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원팀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또는 방사청이 키를 잡아야 한다. 분산된 형태의 각개 전투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고 말했다.
■ 혁신의 최전선에서 비즈니스의 미래를 봅니다. 첨단 산업의 '미래검증 보고서' 더중플에서 더 빨리 확인하세요.
「

‘몸빵 드론’으로 드론 잡는다…누가 K-팔란티어 될 상인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992
“AI판 통째 뒤집을 혁신 온다” 나델라 MS CEO 단독인터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673
젠슨황, 두 달만에 무릎 꿇렸다…“치매도 고친다” 양자컴 진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4972
착한데 지독하다, 이해진 컴백…‘10조 클럽’ 네이버에 생길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200
」
어환희·강광우 기자 eo.hwanhe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