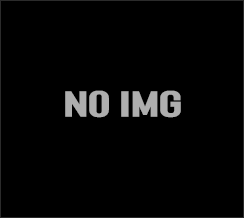우리나라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강국(G3) 도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인프라·인재·기술 등을 총망라해 국가적 LLM을 개발, 오픈소스 형태로 모든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비공개 AI 현안 좌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네이버, 카카오, 삼성·LG 등 기업에서 LLM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AI 사업을 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모두 합쳐도 빅테크 1개 기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AI 현안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진기자
정부가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과 충분한 데이터, 인재·기술력을 기반으로 자체 AI 생태계 조성에 필수인 LLM 등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한국형 LLM 개발을 비롯해 합리적인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한 법·제도 마련, 국가AI컴퓨팅센터 중심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한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달 중 정부가 기업과 학계·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시작할 AI기본법에 불명확한 조항이 있는 만큼 하위법령에서 '고영향 AI' 정의 등 구체화를 주문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AI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관련법인 만큼 혁신 선도와 합리적인 규제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해야 할 기회라고 제안했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AI가 의사결정 주체로 높은 영향을 미칠 때만 의무를 부과할지 규제 대상 범주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명확한 고영향 요건이 나와야 책임성 원칙에 기반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주용 스캐터랩 변호사는 “규제를 신설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 따른다는 기본 컨센서스가 있는데 AI산업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AI G3 도약을 위해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의 법·제도가 아닌 미국·중국 등 선도 국가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AI 관계부처 고위공직자들은 이날 업계·학계 의견을 AI기본법과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과 산업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AI위원회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약속했다.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리더십과 경쟁력을 확보, 글로벌 AI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AI기본법 개정안 제시 등 의견 개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