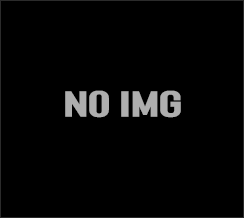사전조치 의무사업자 포함됐지만
방통위에 "비용 감당 어렵다" 의견
차단 전 13~27초 열람 가능한 상황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인 구글과 메타가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게시 전 식별해 차단하라'는 국내법 내용에 대해 "엄청난 비용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우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촬영물을 사전 차단해 인터넷상에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소유한 빅테크들이 반기를 든 것이다. 국내 최대 이용자 수를 가진 플랫폼을 운영하는 해외 빅테크가 비협조하면서 불법촬영물 사전 차단 정책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메타는 최근 방통위에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사전 비교·식별 시스템을 재구축하려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업로드되는 방대한 영상물을 사전 필터링하려면 업로드 시간이 지연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사후 비교·식별 조치로도 이용자 보호 효과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메타가 입장을 전한 건 방통위가 테크기업들을 대상으로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점검한 후 올 초 시정명령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테크기업인 네이버도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 역시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필터링을 사전 적용하면 게시물 올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전차단 조치를 미루고 있다. 다만 네이버 관계자는 "AI 활용해서 사전차단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가능하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이후 다음 해인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플랫폼 기업들이 비교·식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는 91개 사업자가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에 속한다.
플랫폼 업계에선 방통위의 법제화가 거대 기업엔 다소 무리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를 비롯해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 80여개사들이 사전 조치를 지킨 것을 감안하면 방통위 요구가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구글과 메타에 대해선 "전세계에서 올라오는 동영상과 사진 게시물이 워낙 많은데 이를 모두 막으려면 비용은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글과 메타의 반기에도 방통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다. 방통위는 사전 조치를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업계 의견을 고려한다며 사후 조치까지 허용하고 있다. 김우석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 과장은 "규제 집행 초기임을 감안해 구글, 메타, 네이버는 열람 가능에서 차단까지의 사업자별로 13~27초가 걸리는데, 이 시간을 더 단축하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런 방통위 입장에 대해 "정부가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할 때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순히 명분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는 법과 규제를 지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들거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일반 대중들이 편익을 누린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업에 선처를 베풀 순 없다"며 "해악을 끼친 점에 대해선 단호하게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