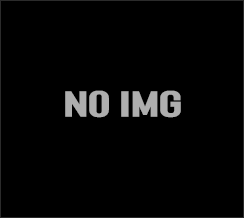곽노필의 미래창
뇌 해마 영상 촬영으로 확인
기억을 꺼낼 방법이 없을 뿐

유아기의 일을 기억하는 못하는 것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Pexels
일반적으로 사람은 태어나서 3살 전까지의 일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는 7살이 돼서야 완전히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그러나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갓난아기도 기억을 생성하는 것으로 믿었다. 성적 충동을 인간 발달의 중요한 요소를 본 그는 어떤 성적인 이유로 뇌가 기억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를 ‘유년기 기억상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아기한테서 기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근자에 들어 프로이트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이 뇌 영상 분석을 통해, 유아기의 일을 기억하는 못하는 것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생후 12개월 된 아기도 최소한 몇분 동안 지속되는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머리가 작은 아기들에게 적합한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장치를 개발했다. 이어 생후 4~25개월 아기 26명을 대상으로 기억 생성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면서 뇌의 기억중추인 해마 활동을 촬영했다. 아기들에게 일련의 사람 얼굴, 사물, 장면 등이 포함된 사진을 보여준 뒤, 20~100초 후 이 사진과 새로운 사진을 섞어 보여주는 실험이었다. 이미 본 사물을 더 오래 보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사진을 응시한 시간도 측정했다.
그 결과 대체로 생후 12개월 이상인 아기들한테서 해마 활동과의 상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을 처음 볼 때 해마 활동이 활발했던 아기는 나중에 같은 사진을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뒤쪽 해마의 활동이 활발했다. 처음에 해마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아기는 같은 사진을 다시 볼 때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연구진은 이는 성인이 기억을 생성하는 방식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아기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뇌 영상 장치로 실험을 하고 있다. 예일대 제공
저장-검색 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연구진은 앞서 2021년엔 생후 3개월 아기의 해마가 ‘통계적 학습’이라는 다른 유형의 기억을 생성한다는 걸 발견해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바 있다. 일화적 기억이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통계적 학습은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와 같은 패턴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유형의 기억은 해마에서 서로 다른 신경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동물 실험에선 해마의 앞쪽 부분(머리 앞쪽에 가까운 부분)에 있는 통계적 학습 경로가 일화적 기억보다 일찍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학습이 더 일찍 작동하는 이유는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구조를 추출하는 이 과정이 언어, 시각, 개념 등의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따라서 유아기 후반부, 즉 생후 1년이 지나면 일화적 기억도 생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번 연구는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이때 생성된 기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연구진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나는 기억은 생성됐으나 장기저장소로 옮겨지지 않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기억이 생성된 후에도 오랫동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없을 가능성이다. 연구진은 아기의 기억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를 이끈 터크 브라운 교수(심리학)는 네이처에 “성인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이 처음 저장된 방식과 뇌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검색 방식 사이의 불일치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인 트리스탄 예이츠 박사(인지심리학)는 “이는 아기의 경험이 훗날의 경험과 매우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며 “기어다니는 것에서 걷는 것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부연 설명했다.

아기 때 기억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폴 프랭클랜드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별도의 해설 논문에서 “이번 연구는 유아기 기억상실이 기억을 생성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생성 후 처리 과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시사한 생쥐 실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며 “생쥐 연구에선 유아기 기억이 뒤쪽 해마에 지속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이 기억은 성인기에 관련 신호나 직접 자극을 통해 끄집어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후속으로 아기 시절에 찍은 동영상을 보고 그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아기 부모들이 매주 아기의 관점에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연구진은 일단 초기 연구에선 이런 기억은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될 때까지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아동기의 해마 기억이 어떤 형태로든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의 공상과학적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대 트레이시 리긴스 교수(아동심리학)는 사이언스에 “이번 실험은 기억이 생성된 직후에만 진행했기 때문에 유아기 기억상실의 비밀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며 “아기의 해마가 일화적 기억을 얼마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메카니즘이 기억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문 정보
Hippocampal encoding of memories in human infants.
DOI: 10.1126/science.adt7570
Babies form fleeting memories.
DOI: 10.1126/science.adw1923
곽노필 선임기자 nopi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