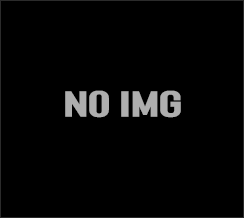상장 지연 속 쪼개기 상장 이중잣대
특례상장 취지 훼손하는 심사 기준
다국적제약사 분사 상장 전략 성공
거래소 심사 병목, IPO 기업 직격탄

한국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수개월간 지연하며 제노스코의 기업공개(IPO)를 가로막고 있다. 앞서 거래소는 여러 바이오기업의 쪼개기 상장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제노스코는 모회사 오스코텍과 매출 구조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거래소의 오락가락 심사 기준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특례상장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례상장 IPO 회사에 매출 구조 잣대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제노스코는 지난해 10월 22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상장심사 가이드북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45영업일(해외 기업은 6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노스코보다 더 늦게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지씨지놈(2024년 11월 29일)은 이미 지난 26일 심사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거래소는 5개월 넘게 제노스코를 심사 중이다. 거래소가 제노스코의 상장을 지연하는 배경은 ‘모회사인 오스코텍과 매출 구조가 같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즉 ‘중복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이라는 것이다.
렉라자는 국내 최초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항암 신약이다. 제노스코와 모회사 오스코텍이 원개발사다.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존슨앤드존슨(J&J)이 유한양행에 매출액 대비 로열티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이를 6대 4 비율로 나눈다. 오스코텍은 유한양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제노스코와 절반씩 나눈다.
반면 제노스코는 매출 구조와 크게 상관없는 특례상장제도로 코스닥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특례상장의 취지는 보유 기술의 혁신성 또는 기업의 성장성을 인정받은 경우, 최소 재무요건(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90억원 이상)만으로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특례상장 바이오회사는 상장 이후 십수년 동안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장 유지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 제도의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매출액 충족 요건도 없애는 방안도 발표했다.
제노스코는 기술성 평가에서 바이오회사 최초로 전문기관 두 곳으로부터 모두 AA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제코스코의 주력 파이프라인은 오스코텍과 완전히 다르다. 제노스코는 ROCK2 저해제와 항체접합분해제(DAC), 오스코텍은 내성 타깃 저분자화합물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다.
중복, 쪼개기 상장 허용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물적분할 상장은 흔히 볼 수 있다. 바이오회사들의 쪼개기 상장은 LG화학이 핵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방식과는 다르다. 바이오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파이프라인 일부를 떼어주는 형태다. 이후 자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조금씩 넘겨주면서, 대규모 투자를 받은 다음 상장까지 시키는 방식이다.
미국 화이자는 2017년 스프링웍스 테라퓨틱스(SpringWorks Therapeutics)를 분사했다. 화이자는 스프링웍스에 주요 파이프라인 4개에 대한 권리를 이전했다. 스프링웍스는 희귀 질환 신약 개발에 집중했고, 2019년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일본 다케다 파마슈티컬은 2021년 7월 힐백스를 설립했다. 다케다의 노로바이러스 백신 후보 HIL-214를 개발하고 상업화하기 위해서다. 힐백스는 다케다로부터 HIL-214에 대한 독점적인 글로벌 개발 및 상용화 권리를 부여받았다. 2024년 4월 힐백스는 나스닥에 입성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회사의 분사는 유망한 약물 후보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전략이다. R&D 자금은 한정돼 있다. 반면 신약 개발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모회사가 특정 파이프라인을 새로운 법인에 이전하면 모회사는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고, 새로운 법인은 신약 고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으면서 외부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
국내 역시 파이프라인 쪼개기로 특례상장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네오이뮨텍은 2015년 T세포 증폭제인 NT-I7을 최대주주 제넥신으로부터 들여왔다. 한국을 제외한 북미와 남미, 중미, 유럽의 전용실시권을 확보했다. 한국 판권을 보유한 제넥신은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상장한 온코닉테라퓨틱스의 핵심 자산은 모회사 제일약품으로 넘겨 받은 자스타프라잔과 네수파립 두 가지다.
제노스코는 2000년 오스코텍이 100% 미국 자회사로 설립했다. 오스코텍은 미국 보스턴에 현지 법인 ‘OCT USA’를 설립했다. 설립 초기 OCT USA는 신약 개발을 하지 못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을 하며 신약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았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벤처캐피탈(VC)이 생소할 정도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OCT USA는 돈을 벌려고 건강기능식품 납품 등의 사업을 했고, 2007년 흑자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OCT USA의 신약 개발은 2008년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가 합류하면서 시작했다. OCT USA의 사명은 고 대표가 합류한지 1년이 지난 후인 2009년 제노스코로 변경했다.
제노스코는 IPO가 불발될 경우 신약 개발업체로서 존립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한다. 제노스코 본사가 있는 보스턴은 현지 인력이 스톡옵션 여부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노스코의 이번 코스닥 상장이 불발되면 모든 신약 개발 연구원들이 이탈, 연구소가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상 렉라자 로열티만 받는 금융회사로 전락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제노스코는 모회사인 오스코텍이 자금을 조달해 줘야만 연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노스코의 이번 상장이 불발되면 장기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이 기사는 한경닷컴 바이오 전문 채널 <한경바이오인사이트>에 2025년 4월 1일 07시21분 게재됐습니다.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