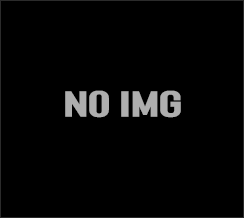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탄핵정국 後 점검해야 할 이슈
5편 수출·재벌 맹신론의 함정
수익→고용→임금→소비→성장
모든 경로서 수출 효과 관측 안 돼
한국 기업, 미국서 고용창출 1위
해외 이전·직상장, 투자 효과 유출로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 등장 막아서
한때 수출이 한국 경제의 모든 것을 떠맡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엔 '수출 맹신'이 되레 한국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수출‧제조 대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했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됐던 인터넷 서비스 관련 기업들은 해외 직상장을 택했다. 수출과 재벌 맹신론의 결과를 알아본다.
![우리나라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의 한 점포에 세일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thescoop1/20250401095709378vjxg.jpg)
우리나라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 서대문구 대학가의 한 점포에 세일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로지 수출이었다. 정부 주장처럼 수출 증가만으로 경제가 성장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마땅하다. 수출 증가로 수출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전체 임금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늘어나면, 구매력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승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은 이중 어느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수출은 2024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매월 56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지만,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024년 1분기 5.4%, 2분기 6.2%, 3분기 5.8%로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수출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 영업이익률만 봐도 2024년 1분기 5.4%, 2분기 7.1%, 3분기 6.1%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보고서).
연간 실질임금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1.1%에 이어 2024년에도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매판매액 증감률은 2022년 –0.3%, 2023년 –1.4%에 이어 2024년에도 –2.2%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3년 연속 감소는 사상 처음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4%, 2024년에도 2.0%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월 25일 내년 경제성장률로 올해보다도 낮은 1.8%를 제시하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이날 우리나라의 수출 맹신론을 이렇게 비판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여년간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을 보면 최근 3~4년 거의 0%였다. 수출 산업 경쟁력이 이미 많이 낮아졌다. 과거처럼 수출로 인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순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증가에 기여한 정도는 실제로 미약하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2023년 1분기 –3.9%포인트, 2분기 –0.8%포인트였고, 3·4분기에는 플러스를 기록해 만회했다(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순수출은 2023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만큼 깎아 먹었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의 빛나는 성과를 내내 홍보했지만, 순수출은 지난해 1분기 4.3%포인트 기여 이후 3·4분기엔 각각 0.9%포인트, 0.1%포인트로 성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기존의 수출 기반 제조산업을 유지한 결과다.

이 총재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무언가를 바꿔보려 했다면 새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 정부가 그랬더라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의 전체 영역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새바람'이 들어갈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4대 재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은 2021년 이후 40%를 넘었다. 30대 재벌 매출은 2022년 GDP의 83.5%, 2023년 GDP의 76.9%였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수출‧제조업 기반 재벌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크지만, 이런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와 고용을 늘려도 우리 경제는 성장하기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로 생산거점을 옮기면서 이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21년 1118억 달러, 2022년 996억 달러, 2024년에도 93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제조업의 해외 생산거점 이전은 이제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조차 잃어버린 듯하다. 수출‧제조 재벌 등 대기업들과 그 협력업체들은 2023년 한해에만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 일자리 2만360개를 미국인들에게 제공했다. 2023년 미국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 낸 나라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미국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2010년대 이후 새로운 산업을 열어젖힐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킨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잇달아 등장했지만, 이들도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아닌 해외로 모회사를 이전해 직상장에 나서는 길을 택했다.
![해외 직상장을 노리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월 라인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사진 | 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1/thescoop1/20250401095712172vjnb.jpg)
해외 직상장을 노리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016년 7월 라인을 뉴욕증시에 상장했다. [사진 | 뉴시스]
사실 그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긴 하다. 중복상장과 잦은 계열사 합병 등으로 4대 재벌이 전체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선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령, 넥슨은 2011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직상장했다. 네이버는 라인을 201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고, 2021년에는 지분 50%를 넘겨 소프트뱅크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시에 직상장했고, 네이버는 웹툰 서비스를 2024년 6월 나스닥에 직상장했다.
어느 나라든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과 산업이 등장하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을 멈춘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가 이전보다 더 빠른 이유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성장의 원인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eongyeon.han@thescoop.co.kr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