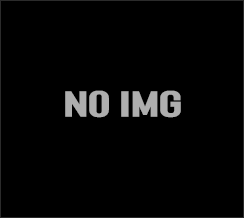프랑스의 저명한 의사 아르망 트루소(Armand Trousseau)는 “모든 과학은 예술에 닿아 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달로 과학과 예술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해지고 있으며,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예술가들에게 마냥 반가운 일일까? 돌이켜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예술가들의 저항을 불러오곤 했다. 19세기 사진술의 발명은 미술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예술은 인간의 ‘정신의 산물’인 반면, 사진은 예술이 아닌 ‘기계적 복제’로 여겨졌다. 사진기는 예술가들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반전과 창조의 계기도 되었다. 사진의 등장은 예술가들에게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추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상주의가 생겨났고 20세기 현대미술 운동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후 라디오와 레코드 기술의 발전으로 다시 한번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으로 우려했다.

필자가 인공지능 코파일럿으로 생성한 라디오, 레코드, AI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은 반(反)예술적 태도를 불러와 당시의 전통적 예술을 철저히 깨뜨리는 시도들이 생겨났다. 예술은 개념적이고 지적 유희로 확장되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독신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진 신부(The Bride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Even)”라는 작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독신자들의 에너지가 기계적 움직임을 통해 위로 올라가지만, 결코 신부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설정한 난해한 개념도이다. 뒤샹에게 미술은 ‘손으로 그린 회화’가 아니라 개념적 사고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그에게는 느닷없는 사고와 우연의 결과물도 예술이었다. 실제로 운송 중 유리가 깨졌을 때 이를 복구하지 않고 작품으로 남기기도 했다. 뒤샹은 기존의 예술 개념을 해체하고 재정의하였으며, 초현실주의와 개념미술(Conceptual Art)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예술계에서는 AI 아트가 시도되면서 기계가 생성하는 예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제이슨 앨런(Jason Allen)이 미드저니(Midjourney) AI를 이용해 제작한 작품(아래 그림 참조)이 미술대회에서 수상하자, “기계가 예술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예술계에서는 기술 발전에 대한 거부나 저항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콜로라도 스테이트 페어 미술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Jason Allen의 작품 Théâtre d‘Opéra Spatial, ArtNew(2024.10.3)
돌이켜 보면, 기술은 예술의 안티테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예술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사진과 카메라의 발전은 이미지 기록을 가능케 했고, 라디오와 레코드 기술은 아름다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이나 레코드 대신 이제 그 자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차지하고 있다. AI는 인간에게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창조와 혁신을 향한 또 하나의 방법론이 되고 있다.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창의성을 촉발하고 인간과 협업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예술은 마법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피카소의 예술 역시 홀로 이룬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은 타자(사람, 로봇, 세상, 환경, 알고리즘 등)의 영향을 받으며 탄생한다. 즉 누군가의 창조 위에서 새로운 창조를 꽃피운다. 그런 점에서 피카소가 즐겨 인용하던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쳐온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서 ‘훔친다’는 의미는 단순한 모방과 복제가 아니라, 모방을 발전시켜 더욱 독창적인 형태로 창조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AI야말로 진짜 보다 더욱 진짜 같은 창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예술가는 아닐까? 실제로 생성형 AI는 미술, 음악,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 창작 방식을 혁신하고 있다. 특히 멀티모달 AI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소리 등을 동시에 처리하여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의 딥드림(DeepDream)은 초현실적인 이미지 생성 기술로, 사진이나 그림을 입력하면 특정 패턴을 반영한 몽환적인 스타일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출처 : 딥드림 https://deepdreamgenerator.com/
세계 최초의 AI 화가 로봇 ‘아이다(Ai-Da)’는 단순히 기존 그림을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예술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AI 연주 로봇 ‘시몬(Shimon)’은 5,000곡 이상의 음악과 200만 개 이상의 음악 모티프를 학습하여 즉흥 연주를 펼치고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융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추론형 AI와 피지컬 AI가 결합된 사례에 가깝다.
근래 런던 테이트 모던에서 개최한 ‘일렉트릭 드림(Electric Dreams)’ 전시에선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자이자 분석자이며, 감성교류의 촉진자로서 혁신적인 예술을 선보였다. 생성형 AI(새로운 화풍의 예술 창작), 추론형 AI(표정, 음성,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예술 제공), 피지컬 AI(로봇 아티스트와 관객 간의 실시간 감성 소통으로 몰입감 극대화) 등 여러 AI 유형이 스며든 아트 전시였다.
이처럼 생성형 AI, 추론형 AI, 피지컬 AI 등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 작품을 다채롭고 흥미 있게 만들고 있다. 예술 발전 협업의 파트너가 되고 전략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딥러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은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며, 기존의 창작 방식을 혁신하는 역할도 한다.
인간과 AI의 협업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이는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편, AI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비용 절감과 창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오픈소스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저비용·고성능 AI의 확산을 촉진하며, 적은 컴퓨팅 리소스로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화 경쟁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AI 기반 예술 창작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가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창작 방식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용한 요소가 될 것이다. 과거, 인간의 정신적 창조물로 여겨졌던 예술이 오늘날 과학과 함께 하는 예술로 변했다. 하지만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라고 설 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만물과 예술의 영장’ 인간은 다시 한번 기발한 상상력을 발동할지 모른다.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수평적 사고, 새로운 창조적 발상으로, 테제·안티테제·신테제의 정반합(正反合)의 위대한 예술을 창조하면 어떨까?

[여현덕 카이스트 G-School 원장/기술경영대학원 교수]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
[제작판매]html5웹미니게임제작 해시게임제작 카드포커게임제작 스포츠토토 카지노 슬롯 에볼루션 토지노 솔루션분양임대재작
 글쓰기
글쓰기